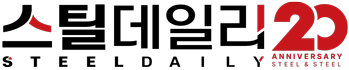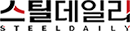CEO의 질문은 새삼스러운 것이었다. 아마도 직원들의 타성을 꼬집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나 싶다. 직원들 역시 CEO의 뜻밖의 질문이 은근한 고민으로 남았다. 깊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곱씹어 생각해봐도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였다.
국내 철강 산업은 넘쳐나는 공급초과 상황에 놓여있다. 수요를 훌쩍 넘어서는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수입산 철강재까지 그야 말로 철강재의 홍수라 말할 법하다.
현실이 그러하다. ‘물량확보=수익’이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어느 회사 품질이 월등히 좋아서 사는 철강재도 많지 않다. 가격이 특별히 저렴해서 사는 일도 찾아보기 힘들다. 덮어놓고 메이커의 이름(name value)만보고 사가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왜 사는지의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의 철강시장에서 어떤 생존해법을 찾아가야하는 지 답을 찾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된 화두를 바꿔보자. 요즘 철근 시장은 여타 철강업계가 부러워할 만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최악의 판매부진과 더 이상 쌓아둘 곳 없는 재고로 가동중단 압박까지 직면했던 불과 몇 달 전과는 정반대의 시황이 연출됐다. 철근을 구매하려는 수요처들이 줄을 서고 치열한 호가경쟁까지 일어나는 아득했던 호시절이 재현된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간 수요자 중심으로 기울어온 철근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덕분에 공급처와 수요처가 적당한 긴장감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고무적이다.
철근 업체들은 간만에 어깨 펴고 장사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의 불만은 많아졌다. 단순히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점에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철근 업체들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실망감의 토로다.
뜨겁게 달아 오른 철근 시장의 호황도 언젠가는 식을 것이다.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 겨우 한 차(車) 내보냈다’는 한숨 섞인 하소연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오랜만에 찾아온 호황이 철근 시장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중한 기회를 값지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균형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실망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질문, ‘고객이 우리 제품을 왜 산다고 생각하나’를 떠올려 보자. 질문의 답을 ‘파트너십(partnership)’에서 찾으면 어떨까 싶다. 고객들이 특별한 차별요소가 없는 우리 제품을 사는 이유가 ‘녹록치 않은 철강시장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상생의 믿음’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정호근 기자
webmaster@steelnsteel.co.kr